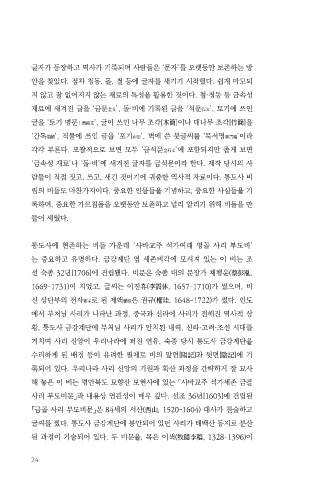Page 24 - 월간 축산보림 2025년 4월호 (Vol 521)
P. 24
글자가 등장하고 역사가 기록되며 사람들은 ‘문자’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
안을 찾았다. 점차 청동, 돌, 철 등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다. 쉽게 마모되
지 않고 잘 없어지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. 철·청동 등 금속성
재료에 새겨진 글을 ‘금문金文’, 돌·비에 기록된 글을 ‘석문石文’, 토기에 쓰인
글을 ‘토기 명문土器銘文’, 글이 쓰인 나무 조각[木簡]이나 대나무 조각[竹簡]을
‘간독簡牘’, 직물에 쓰인 글을 ‘포기布記’, 벽에 쓴 붓글씨를 ‘묵서명墨書銘’이라
각각 부른다. 포괄적으로 보면 모두 ‘금석문金石文’에 포함되지만 좁게 보면
‘금속성 재료’나 ‘돌·비’에 새겨진 글자를 금석문이라 한다. 제작 당시의 사
람들이 직접 짓고, 쓰고, 새긴 것이기에 귀중한 역사적 자료이다. 통도사 비
림의 비들도 마찬가지이다. 중요한 인물들을 기념하고, 중요한 사실들을 기
록하며, 중요한 가르침들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비들을 만
들어 세웠다.
통도사에 현존하는 비들 가운데 ‘사바교주 석가여래 영골 사리 부도비’
는 중요하고 유명하다. 금강계단 옆 세존비각에 모셔져 있는 이 비는 조
선 숙종 32년[1706]에 건립됐다. 비문은 숙종 대의 문장가 채팽윤(蔡彭胤,
1669-1731)이 지었고, 글씨는 이진휴(李震休, 1657-1710)가 썼으며, 비
신 상단부의 전자篆字로 된 제액題額은 권규(權珪, 1648-1722)가 썼다. 인도
에서 부처님 사리가 나타난 과정, 중국과 신라에 사리가 전해진 역사적 상
황, 통도사 금강계단에 부처님 사리가 안치된 내력, 신라·고려·조선 시대를
거치며 사리 신앙이 우리나라에 퍼진 연유, 숙종 당시 통도사 금강계단을
수리하게 된 배경 등이 유려한 필체로 비의 앞면[陽記]과 뒷면[陰記]에 기
록되어 있다. 우리나라 사리 신앙의 기원과 확산 과정을 간략하게 잘 묘사
해 놓은 이 비는 평안북도 묘향산 보현사에 있는 「사바교주 석가세존 금골
사리 부도비문」과 내용상 연관성이 매우 깊다. 선조 36년[1603]에 건립된
「금골 사리 부도비문」은 84세의 서산(西山, 1520-1604) 대사가 찬술하고
글씨를 썼다. 통도사 금강계단에 봉안되어 있던 사리가 태백산 등지로 분산
된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. 두 비문을, 목은 이색(牧隱李穡, 1328-1396)이
24